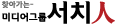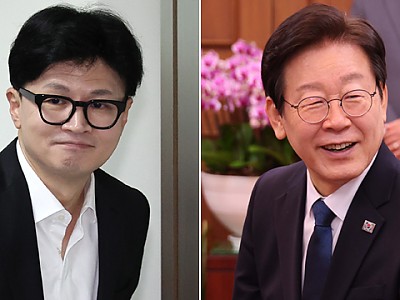문화
연대성을 부정하는 것은 헛된 짓이다
김보경 기자
승인 2020.02.13 10:29
알베르 카뮈는 <페스트>를 통해 전염병으로 인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 격리자들은 고통스러운 질식 상태를 경험한다. 백신이 없는 두려운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도시는 폐쇄되고 그 도시 속에 갇혀버린 시민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책은 시종일관 전염병에 노출된 사람들의 절망과 체념을 실감 나게 표현한다. 카뮈는 페스트라는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페스트가 아닌 수인들이라는 제목을 붙일 계획이었다고 전해진다.
그 사실만으로도 카뮈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도덕적 딜레마를 말함과 동시에 그러한 해석을 삶의 전체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비극의 소용돌이에서 처한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은 책속에도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존재한다.
인간이 재앙에 대응하는 세 가지 방식
지금 이 도시에서 생긴 사태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믿는 방관자이자 도피적 태도의 기자 랑베르. 설교를 통해 재앙은 사악한 인간들에 대한 신의 벌임을 역설하면서 재앙이 오히려 인간의 길임을 제시하는 초월적 태도의 파늘루 신부. 악과 죽음과 질병을 동반한 세계를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의사 리유. 그들을 통해 재앙 앞에 서있는 인간의 민낯을 본다.
걷잡을 수없이 전염병이 번지고 죽은 사람들이 매장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생이별을 보고 겪은 사람들은 이 재앙이 개인적 운명을 초월하여 역사적 사건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이 재앙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각기 다른 세 가지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같은 곳을 바라본다.
전염병으로부터 영원한 승리와 결정적인 개선으로 끝내지는 않는다는 점이 페스트라는 책의 인상적인 끝맺음이자 카뮈 다운 결론이었다.
이 연대기가 결정적인 승리의 기록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기록은 다만 공포와 그 공포가 지니고 있는 악착같은 무기에 대항하여 수행해 나가야 했던 것 그리고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재앙을 용납할 수도 없기에 그 대신 의사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한 증언일 뿐이다.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를 작용하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조심하게 된다. 전염병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하지만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따뜻함은 존재한다. 격리된 사람들은 방 번호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쪽지로 전하고 완치자들은 하나 둘씩 퇴원을 하고 있다. 나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마음으로 치료를 돕는 의사들이 있고 감염 우려 때문에 직접 마주치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공무원들도 많다. 해결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지금쯤은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서로를 격려해도 되지 않을까.
책은 시종일관 전염병에 노출된 사람들의 절망과 체념을 실감 나게 표현한다. 카뮈는 페스트라는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페스트가 아닌 수인들이라는 제목을 붙일 계획이었다고 전해진다.
그 사실만으로도 카뮈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도덕적 딜레마를 말함과 동시에 그러한 해석을 삶의 전체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비극의 소용돌이에서 처한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은 책속에도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존재한다.
인간이 재앙에 대응하는 세 가지 방식
지금 이 도시에서 생긴 사태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믿는 방관자이자 도피적 태도의 기자 랑베르. 설교를 통해 재앙은 사악한 인간들에 대한 신의 벌임을 역설하면서 재앙이 오히려 인간의 길임을 제시하는 초월적 태도의 파늘루 신부. 악과 죽음과 질병을 동반한 세계를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의사 리유. 그들을 통해 재앙 앞에 서있는 인간의 민낯을 본다.
걷잡을 수없이 전염병이 번지고 죽은 사람들이 매장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생이별을 보고 겪은 사람들은 이 재앙이 개인적 운명을 초월하여 역사적 사건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이 재앙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각기 다른 세 가지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같은 곳을 바라본다.
전염병으로부터 영원한 승리와 결정적인 개선으로 끝내지는 않는다는 점이 페스트라는 책의 인상적인 끝맺음이자 카뮈 다운 결론이었다.
이 연대기가 결정적인 승리의 기록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기록은 다만 공포와 그 공포가 지니고 있는 악착같은 무기에 대항하여 수행해 나가야 했던 것 그리고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재앙을 용납할 수도 없기에 그 대신 의사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한 증언일 뿐이다.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를 작용하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조심하게 된다. 전염병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하지만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따뜻함은 존재한다. 격리된 사람들은 방 번호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쪽지로 전하고 완치자들은 하나 둘씩 퇴원을 하고 있다. 나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마음으로 치료를 돕는 의사들이 있고 감염 우려 때문에 직접 마주치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공무원들도 많다. 해결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지금쯤은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서로를 격려해도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