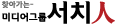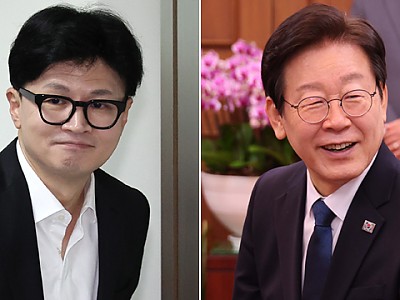문화
현장을 누비는 시인의 생생한 시집
이명옥 기자
승인 2020.02.17 14:29
설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이하 시인에게 시집을 선물로 받았다. 냉큼 받아 집에 돌아와 펼쳐보니 예사 시집이 아니다. 가죽 끈으로 정성스럽게 묶은 수작업 환갑 기념 시집이다. 시인만의 방법으로 예순 생일을 기념한 것이다.
김이하 시인은 <눈물에 금이 갔다>를 비롯 10여 권의 시집과 에세이집을 낸 중견 시인이다. 그는 문학을 하는 시인이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법이 없다. 광장이나 문학 행사장에 늘 카메라를 메고 나타나 현장을 기록하는 사진작가이기도해서 동네 아저씨처럼 푸근한 시인이다.
표지가 남다른 <그냥, 그래>라는 손작업으로 만든 이순 시인의 시집 속에 그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 궁금했는데 시집 앞부분에 담긴 이인휘 소설가의 글에 시를 읽기도 전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일상의 풍경이 추적추적 내리는 빗물 같은 언어로 스며 있는 그의 외로운 시들. 그렇다. 그는 그렇게 한 갑자를 살아왔고 가난하고 소박한 시인의 눈에 비친 삶과 일상을 늘 진솔한 일상의 시어로 담아냈다.
그의 시는 현란한 수사나 난해함 현학적인 어휘와 거리가 멀다. 글과 삶의 간극이 없는 글이다. 글과 삶의 간극이 없는 글이기에 그냥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네 일상 역시 대부분 그냥 그런 삶이기 때문이다.
홍제천의 하루하루를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는 시인, 영천 시장반찬가게 풍경이나 거리로 내몰린 이들의 아픔의 현장을 조용히 다가와 위로하듯 담아내는 시인이 김이하다. 그냥 그런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삶을 언어로 담아내지 못헤 그냥 흘러보낸다. 그냥 그런 일상도 시인이 담아내면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
이순을 넘긴 그의 일상이 해질녁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아니라 비온 뒤 갠 맑은 날 아침 햇살처럼 밝고 따사로운 날이 되면 좋겠다. 가난한 예술가의 예술혼이 자본의 악다구니 속에 매몰되지 않고 빛나는 햇살이 되면 좋겠다.
세월호 진상이 규명되고,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고 시인이 가난으로 눈물짓지 않는 세상이 된다면 시인은 다른 노래를 들려줄 것이다. 눈물에 금이 간 시를 짓는 대신 영혼의 깊은 샘물을 길어 올려 찬란한 환희의 송가를 지을 테니까. 시인의 환희의 송가를 들을 그날을 기디려보리라.
김이하 시인은 <눈물에 금이 갔다>를 비롯 10여 권의 시집과 에세이집을 낸 중견 시인이다. 그는 문학을 하는 시인이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법이 없다. 광장이나 문학 행사장에 늘 카메라를 메고 나타나 현장을 기록하는 사진작가이기도해서 동네 아저씨처럼 푸근한 시인이다.
표지가 남다른 <그냥, 그래>라는 손작업으로 만든 이순 시인의 시집 속에 그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 궁금했는데 시집 앞부분에 담긴 이인휘 소설가의 글에 시를 읽기도 전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일상의 풍경이 추적추적 내리는 빗물 같은 언어로 스며 있는 그의 외로운 시들,
나이든 이빨이 빠져 나간 자리에서 고통으로 뭉쳐 있는 시들,
목숨에 대한 깊은 사랑이 넘실거려 가슴 시리게 하는 시들,
황폐한 세상 밖으로 내몰려 깊은 숲 어둠처럼 웅크리고 있던 그의 심장 소리가 백지 위에 상처로 새겨져 있다.
지쳐 버린 긴 그림자를 끌고 가는 달빛처럼 아련하게,
단칸방으로 숨어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 먼산을 바라보는 한 줌 햇살처럼 눈부시게" /이인휘 소설가
일상의 풍경이 추적추적 내리는 빗물 같은 언어로 스며 있는 그의 외로운 시들. 그렇다. 그는 그렇게 한 갑자를 살아왔고 가난하고 소박한 시인의 눈에 비친 삶과 일상을 늘 진솔한 일상의 시어로 담아냈다.
그의 시는 현란한 수사나 난해함 현학적인 어휘와 거리가 멀다. 글과 삶의 간극이 없는 글이다. 글과 삶의 간극이 없는 글이기에 그냥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네 일상 역시 대부분 그냥 그런 삶이기 때문이다.
요즘 내가 사는 건, 그냥 그래
가슴에 박힌 큰 말뚝보다 자잘한 가시에 아파하며
막 화를 내고 그래, 입으로 욕도 뱉고 살아
어머님 가시고, 아우도 스러지고
그들의 궤적이 뒤꼭지에 퀭하게 박혀도
아직 견딜 만은 한거지
(중략)
흐린 저녁 풍경에 잠겨서
왜 이런가 모르겠다. 생각해 보니
이 가을도 더욱 깊어가는 거라는거
어머님도 아우도 어느덧 까마득한 얼굴이고
사람 빈 자리가 휑한 바다 같고 하늘 같아서
눈 두고 바라볼 곳을 모른다는 거
그래도 살아 있다는 거,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일부
홍제천의 하루하루를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는 시인, 영천 시장반찬가게 풍경이나 거리로 내몰린 이들의 아픔의 현장을 조용히 다가와 위로하듯 담아내는 시인이 김이하다. 그냥 그런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삶을 언어로 담아내지 못헤 그냥 흘러보낸다. 그냥 그런 일상도 시인이 담아내면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
이순을 넘긴 그의 일상이 해질녁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아니라 비온 뒤 갠 맑은 날 아침 햇살처럼 밝고 따사로운 날이 되면 좋겠다. 가난한 예술가의 예술혼이 자본의 악다구니 속에 매몰되지 않고 빛나는 햇살이 되면 좋겠다.
차마 슬프단 말 못하고
무너진 억장을 여린 손 하나로 쓰다듬고
천장에 뭉게구름인 듯
당신 웃음이나 매달고 누웠네
습자지 같은 가슴에
슬프단 말을 가만히 안고 돌아와
풀어진 한 나절
귀엔 세얼호 엔진 소리만 요란하네 – 가장 얇은 가슴 일부
세월호 진상이 규명되고,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고 시인이 가난으로 눈물짓지 않는 세상이 된다면 시인은 다른 노래를 들려줄 것이다. 눈물에 금이 간 시를 짓는 대신 영혼의 깊은 샘물을 길어 올려 찬란한 환희의 송가를 지을 테니까. 시인의 환희의 송가를 들을 그날을 기디려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