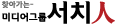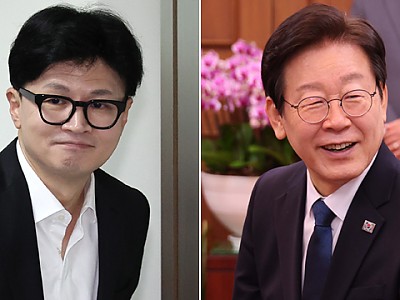문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삶을 가진 사람
김유경 기자
승인 2020.02.11 13:29
내가 박노해를 떠올린 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문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지난해 8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을 운운하며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을 겨냥한 때다. 박노해는 사노맹의 수괴로 지목되어 1991년 투옥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노동자 시인이다. 그의 첫 시집은 출간 당시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안긴 <노동의 새벽>(풀빛, 1984)이다.
미뤘던 그의 근황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뒤진다. 국경 너머 가난과 분쟁 현장에서 "생명 평화 나눔"을 일구는 삶이 넘쳐흐른다. 최근 두 번째 사진에세이를 출간했다는 보도가 있다. 한때 변절 혐의를 받은 그의 행보를 확인하고자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를 얼른 주문한다. "노동자 시인"에서 "철저한 조직 운동가"를 거친 그가 "개인 있는 우리"로 진화했을까.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실다운 변화가 흔한 건 아니다.
박노해는 필명이자 줄임말이다. 본딧말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다. 감시를 피하려던 필명은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얼굴 없는 시인"의 꼬리표로 유명짜하게 통용된다. 문득 그의 아내는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다. 당시 노동 현장에서 꽃핀 계층을 달리한 두 사람의 결합에 관심이 쏠려 대표적인 시 「시다의 꿈」보다 선호했던 "신혼 일기"(<노동의 새벽>, 풀빛, 1984)가 떠올라서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는 그의 질긴 역마살을 보여준다. 등장하는 지역이나 지명만도 열 군데가 넘는다. 히말라야, 수단, 버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남미 안데스 고원, 티베트, 이란(이라크), 인도, 터키, 페루 등이다. 그가 몸을 부렸던 공장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보다 나을 곳 없는 험지들이다. 그곳에서 그는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른바 사람(삶) 순례다.
이해타산에 밝지 않은 삶은 살아 있음을 느끼는 데 충실하다. 자연의 순리를 터득해 "계절 따라 살아온 날들"("계절이 지나가는 대로")을 이어가는 축이다. 그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보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삶을 가진 사람"("안데스의 멋쟁이 농부")이길 선택한 거다. 그런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 그 사랑이면 살아지는 것이니"("카슈미르의 저녁")가 죽음을 디딘 발품 팔기의 근간이리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기린 그의 시 "멀리 가는 그대여"가 지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을 울렸다. 노회찬재단(이사장 조돈문) 창립 1주년 기념공연 "우리, 이어지다"에서다. 이런저런 고비를 넘기며 좀 더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성숙한 그의 과거 다짐,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는다"가 허튼소리가 아니었음에 마음을 놓는다. 팍팍한 일상에서 높이 날아 멀리 보려 그의 물음 둘을 공유한다.
미뤘던 그의 근황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뒤진다. 국경 너머 가난과 분쟁 현장에서 "생명 평화 나눔"을 일구는 삶이 넘쳐흐른다. 최근 두 번째 사진에세이를 출간했다는 보도가 있다. 한때 변절 혐의를 받은 그의 행보를 확인하고자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를 얼른 주문한다. "노동자 시인"에서 "철저한 조직 운동가"를 거친 그가 "개인 있는 우리"로 진화했을까.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실다운 변화가 흔한 건 아니다.
박노해는 필명이자 줄임말이다. 본딧말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다. 감시를 피하려던 필명은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얼굴 없는 시인"의 꼬리표로 유명짜하게 통용된다. 문득 그의 아내는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다. 당시 노동 현장에서 꽃핀 계층을 달리한 두 사람의 결합에 관심이 쏠려 대표적인 시 「시다의 꿈」보다 선호했던 "신혼 일기"(<노동의 새벽>, 풀빛, 1984)가 떠올라서다.
길고긴 일주일의 노동 끝에 / 언 가슴 웅크리며 / 찬 새벽길 더듬어 / 방안을 들어서면 / 아내는 벌써 공장 나가고 없다 // 지난 일주일의 노동, / 기인 이별에 한숨 지며 / 쓴 담배연기 어지러이 내어 뿜으며 / 바삐 팽개쳐진 아내의 잠옷을 집어 들면 / 혼자서 밤들을 지낸 외로운 아내 내음에 / 눈물이 난다 // 깊은 잠 속에 떨어져 주체 못할 피로에 아프게 눈을 뜨면 / 야간일 끝내고 온 파랗게 언 아내는 / 가슴 위에 엎으러져 하염없이 쓰다듬고 / 사랑의 입맞춤에 / 내 몸은 서서히 생기를 띤다 // 밥상을 마주하고 / 지난 일주일의 밀린 얘기에 / 소곤소곤 정겨운 / 우리의 하룻밤이 너무도 짧다 // 날이 밝으면 또다시 이별인데, / 괴로운 노동 속으로 기계 되어 돌아가는 / 우리의 아침이 두려웁다 // 서로의 사랑으로 희망을 품고 돌아서서 / 일치 속에서 함께 앞을 보는 / 가난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혼행진곡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는 그의 질긴 역마살을 보여준다. 등장하는 지역이나 지명만도 열 군데가 넘는다. 히말라야, 수단, 버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남미 안데스 고원, 티베트, 이란(이라크), 인도, 터키, 페루 등이다. 그가 몸을 부렸던 공장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보다 나을 곳 없는 험지들이다. 그곳에서 그는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른바 사람(삶) 순례다.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우리 삶은 속셈 없는 마음과 마음이 빚어가는 것. ("광야의 환대" 중에서)
이해타산에 밝지 않은 삶은 살아 있음을 느끼는 데 충실하다. 자연의 순리를 터득해 "계절 따라 살아온 날들"("계절이 지나가는 대로")을 이어가는 축이다. 그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보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삶을 가진 사람"("안데스의 멋쟁이 농부")이길 선택한 거다. 그런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 그 사랑이면 살아지는 것이니"("카슈미르의 저녁")가 죽음을 디딘 발품 팔기의 근간이리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기린 그의 시 "멀리 가는 그대여"가 지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을 울렸다. 노회찬재단(이사장 조돈문) 창립 1주년 기념공연 "우리, 이어지다"에서다. 이런저런 고비를 넘기며 좀 더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성숙한 그의 과거 다짐,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는다"가 허튼소리가 아니었음에 마음을 놓는다. 팍팍한 일상에서 높이 날아 멀리 보려 그의 물음 둘을 공유한다.
나는 걸음마다 황무지를 늘려가는 사람인가. / 걸음마다 푸른 지경地境을 넓혀가는 사람인가. ("누비아 사막의 농부" 중에서)
모든 것을 쓸어가는 시간의 바람 앞에 /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살아날까. / 무엇이 잊혀지고 무엇이 푸르를까. / 역사의 조망에 비추어 정녕,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올리브나무 신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