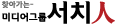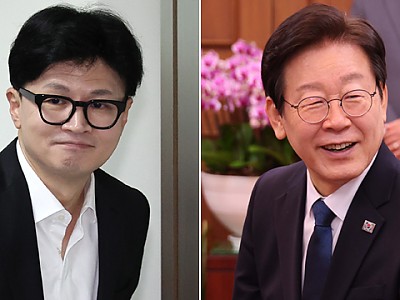문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용기
김유경 기자
승인 2019.12.06 10:31
크리스 조던은 사진(영상)작가이자 "문화적 활동가"다. 그는 전설적인 바닷새, 알바트로스에 앵글을 맞춘다. 심지어 울면서 알바트로스가 겪는 초현실적 환경 재앙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어미가 먹이라 여겨 바다에서 물어다 준 플라스틱을 먹고 게우다 눈감는 새끼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는다. 알바트로스의 떼죽음을 발견한 당시의 절망을 딛고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선 그의 육성이 <크리스 조던>에 생생하다.
<크리스 조던>은 총 3부로 되어 있다. 1부는 그가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 "알바트로스"의 내용을 영어 원문과 함께 소개한다. 2부는 한국 청중들과 대화한 내용을 그의 산문처럼 정리해 들려준다. 3부는 이 책을 펴낸 인디고 서원과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모은 내용이다. 형식을 달리해 그가 지향하는 바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구성인 셈이다.
크리스 조던이 바라는 건 세상의 변화다. 북태평양 미드웨이섬에 서식하는 알바트로스의 죽음을 애도해서다. 그는 애도가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고 말한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슬픔도 힘이 된다"면서. "슬픔도 힘이 된다"는 내 귀에 익은 명제다. 양귀자 소설 제목으로, DW 깁슨의 다큐멘터리 작품명으로 유명해서다. 그 명제의 슬픔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사회 구성원 합심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크리스 조던>이 클로즈업한 알바트로스 죽음은 지구적 차원의 플라스틱 공해 문제다. 크리스 조던은 북태평양 외딴섬의 날짐승까지도 공격하는 심각한 문제적 현실을 직시하길 권한다. 그에 따른 슬픔에 노출되는 걸 피하지 말라고,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슬픔을 치유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아름다움은 어둠(슬픔)에 가려진 밝음과 같아서다. 문제적 현장의 목격자가 되어 어둠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눈길을 돌리지 않는 용기를 내려면, 이해득실보다 마음 결속을 중시해야 한다. 그건 스스로를 상대에게 내맡기는 것일 수 있다. 좋은 예가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 얘기다. "서로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아질 때까지 춤을 춘다." 그건 동화보다는 공감과 공존, 공생을 위해서다. 결국 "서로 동작을 맞추는 새들은 60년 넘도록 평생의 짝이 된다." 절로 "각자가 새로운 생명을 위해 협력하는" 종족보존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시급한 건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누구든 사랑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의식이 변화한다. 사랑과 보편성이 함께하는 거다. 홈리스를 선택한 크리스 조던의 언행일치도 그중 하나다. "플라스틱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합리적 관점도 그렇다. 세상과의 간격을 줄이려는 그는 스스로를 환경운동가 대신 "문화적 활동가"라 일컫는다.
책장 넘기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도 <크리스 조던>의 울림이 크다. 사회적으로 극적인 일들이 자주 터지는 요즘이라서 3부 맺음말은 특히 그렇다.
"저에게 용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그것이 두려운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에 두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어떤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용기를 기꺼이 내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