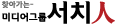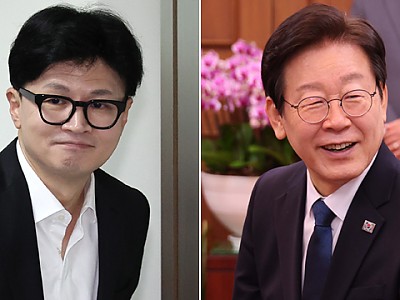문화
"언제 오냐"는 아빠의 전화...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안소민 기자
승인 2019.12.06 17:31
며칠 전 엄마랑 외출을 했을 때였다. 생각보다 일정이 늦어져 저녁식사 시간이 가까워졌다. 해는 이미 진 뒤라 컴컴했고 엄마의 마음은 급해 보였다. 아니다 다를까, 엄마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희한하게 벨소리마저 신경질이 난 듯했다. 집에 계시는 아빠였다. 아빠는 "어디냐", "언제 오냐"고 단 두 마디 물어보셨을 뿐이지만, 우리는 안다. 그 말의 숨은 뜻을. 빨리 와서 저녁을 챙겨달라는 뻔한 은유라는 것을.
언제쯤이면 밥하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칠십이 가까운 엄마와 마흔을 넘긴 딸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깜깜한 하늘에 답이 있을 리 없다.
언제쯤이면 밥하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몇 년 전이었나. 한 지자체에서 은퇴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요리강좌를 열었다. 지금은 그런 강좌가 흔하지만, 그때는 꽤나 신선했다. 빙빙 돌려 설명했지만, 결론은 은퇴 후 "삼식이"들을 위한 요리강좌다. "이제 그 나이 정도 됐으니, 네가 먹을 건 네가 만들어 먹을 줄 알아라"는 취지다.
머리 희끗한 초로의 남성들이 앞치마를 입고,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웃음을 지으며 지지고 볶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너무 좋다, 재미있다"며 새로운 놀이를 배운 듯 기뻐했다. 늙은 유치원생들 같았다. 처음에는 그 강좌가 기발하다 생각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게 좀 한심한 거다.
무슨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심화과정을 밟겠다는 것도 아니다. 먹고 사는 음식하는 법을 이제야 배우겠다는 것이다. 저 머리 희끗한 나이에. 물론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배우겠다니 다행이다 싶었지만, 만약에 저 나이에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할까 싶었다.
물론 요즘은 배달음식과 즉석음식, 밀키트(간편조리세트) 종류가 워낙 많아서 굳이 "지지고 볶고" 할 필요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루이틀이다. 그 뒤에는 자녀(딸 또는 며느리)들이 당번을 서거나 반찬 셔틀을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홀로 계신 아버지의 "어디니", "언제 오니"라는 말은 자녀를 부담스럽게 만들 것이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슬픈 일이다.
한끼 식사, 한줌의 여유가 고픈 여성과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여성들은 음식을 만든 당사자이지만 식탁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됐다. 하루종일 고된 몸으로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만들어가며 "진지상"을 올리고 난 뒤에도, 여성(엄마)들은 부뚜막에서 식은 밥을 먹거나 가족 누군가 남긴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신화처럼 대물림된다.
없는 살림에 그래도 내 가족만큼은 배불리 먹여 살려보겠다는 엄마의 숭고한 사랑은 눈물겹긴 하지만 당사자에겐 너무 잔인했다. 그것을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요구하는 사회는 미개한 사회다.
엄마들은 어쩔 수 없으니 그랬다치자. (사실, 엄마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런 사실을 "숭고한 아름다움"처럼 되새기며 여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예전처럼 먹을 게 궁하지는 않아서, 굶는 엄마야 없겠지만, 요리와 식탁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미화해서 둘러씌우는 게 문제다.
예술사회학자 이라영이 쓴 <정치적인 식탁>은 우리의 식탁을 둘러싼 불평등과 억압, 강요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우리가 별 생각없이 먹는 밥 한 숟갈과 마주하는 식탁에 얼마나 많은 불평등함과 부조리한 차별이 담겨 있는지 세심하게 보여준다. 주로 여성들의 사례를 다루었지만 비단 여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 끼의 식사, 한 줌의 여유에 허덕이는 이 시대 모든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으나 식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은 사람들, 하루종일 달콤하고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들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빵 한 쪽도 입에 넣기 어려운 제빵사들, 동네 미장원에서 손님 머리 말아놓고 한쪽에서 짜장면을 먹는 미용사들처럼 식탁에 앉기 어려운 모든 노동자의 시간에 대해 (p.131)
간혹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투덜거릴 때가 있다. 메뉴가 희한하다는 둥, 간이 안 맞다는 둥...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그렇게 우리는 퉁친다. 남이 차려주는 밥은 항상 맛있다. 결론은 항상 성급한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나니 달리 보인다. 생각해보니 그 시각에도 불특정 다수의 한 끼를 책임지는 "여사님"들의 노동이 있었다. 그들의 점심 한 끼는 또 어떨까. 밥 한 끼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밥 한 끼가 그렇게 무섭다. 내 입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도 생각하자는 이야기다.